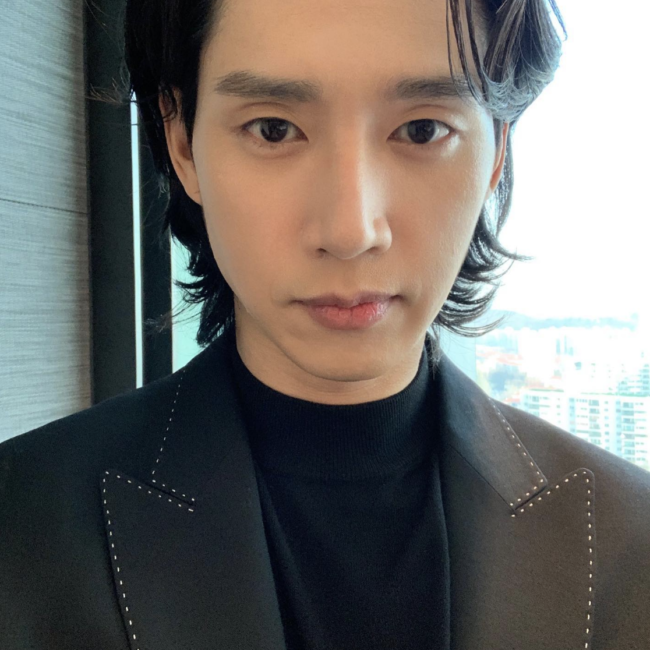테크노는 열반의 꿈을 꾸는가?
힙스터가 테크노 클럽으로 집결하고 있다. 마음을 비우러, 에너지를 정돈하러, 혹은 하루를 열고 마치며 스트레칭을 하러.

이태원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힙스터 사이에서는 테크노 클럽이 입소문이 났다. 4월의 마지막 토요일, 해외 테크노 DJ가 게스트로 온다고 알려진 클럽 ‘링’ 앞에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긴 줄이 늘어섰다. 클럽 안은 DJ 부스 앞부터 입구까지 각자의 리듬을 타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다른 테크노 클럽에서 본 익숙한 얼굴도 더러 있었다. 잠깐 쉬러 밖에 나온 길에 거짓말처럼 옛 대학 동기를 만났다. “나? 코로나 때도 꼬박꼬박 왔어. 심지어 지금 남자 친구 처음 만날 때 그랬거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테크노 클럽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클럽에 같이 간 건 힙합 클럽 ‘케익샵’이었다.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클럽을 다닌 친구는 ‘테크노의 점진적 부상이 시대 흐름인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양양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페스티벌 <디에어하우스> 기획자 박민규 씨는 이렇게 말했다. “가수 이정현이 부른 곡 중에 테크노 베이스가 많잖아요. 1980년대 후반부터 테크노가 유행을 탔는데, 그 문화가 지금 밀려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클럽 ‘베톤부르트’와 ‘콘크리트 바’를 운영하는 동시에 DJ Kim.Qna로 활동 중인 김균하 씨는 “팬데믹으로 인한 2년 공백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음악을 접하던 새로운 세대가 한 번에 유입된 데다, 많은 DJ가 개인 작업에 몰두할 시간을 확보하며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라고 설명했다. “특히 DJ가 오너인 중소 규모의 클럽이 많아졌어요. 덕분에 클럽마다 각자의 색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죠.”
테크노의 핵심은 심장을 울리는 박자감에 있다. 최근 테크노 파티나 페스티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DJ CHAE는 “친구들이 ‘테크노가 뭐냐’고 물으면 예전에 수험생 사이에서 유행한 ‘엠씨스퀘어’를 예로 들어줘요. 집중력을 높이려고 ‘삐삐삐’ 하는 기계음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죠”라고 설명했다. “테크노는 제게 음악이라기보다는 정신적 무아지경, 집중력을 끌어모으는 명상의 단계에 도달하는 ‘박자감’이었어요.” 테크노 클럽에서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집중도가 달라진다. 테크노 중에서도 아주 어둡고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딥 테크노’ 장르로 알려진 클럽 ‘벌트’에서 사람들은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한다. 링과 벌트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새벽 3시쯤 집에 온 날은 이상하게 개운했다. 심신은 지쳤지만, 정신은 온전히 깨어나 영혼까지 맑아진 상태라고 할까? 벌트에 갔을 때는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온 뒤라 무척 지쳐 있었다. 1시간 정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니 눈이 감기고 다리가 무거웠다. 그러다 DJ가 바뀌고, 사운드가 한층 깊어질 무렵 갑자기 비트가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와 같이 박동하는 듯했다. 주변 잡소리가 사라지고 몸 안에 사운드가 가득 찼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듯한 어쩌면 코마 상태에 가까웠다. 레이버 사이에서는 이 상태를 ‘트랜스’라고 표현한다.
김균하 씨는 “테크노는 댄스뿐 아니라 명상할 때도 활용하기 좋아요. 특히 앰비언트 테크노는 명상음악으로 자주 활용되죠”라고 설명했다. “베톤부르트에서 음악을 트는 DJ 중 음악치료사가 있어요. 명상음악을 디깅하다가 앰비언트 테크노에 빠져 디제잉을 배우게 된 케이스예요. 실제로 음악 치료 관련 강의에서도 앰비언트 테크노를 활용한다더군요.” DJ ROXY로 활동하는 동시에 프리랜스 요가 강사이기도 한 서현아 씨는 작년 <DCL 페스티벌>에 DJ 겸 요가 강사로 참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테크노 믹스셋을 요가 클래스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연에서도 전자음악과 비슷한 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죠. 풀벌레 소리도 그렇고, 새 중에서 일정 음을 반복해 소리 내는 종도 있잖아요.” 요가와 테크노의 공통점에 대해 좀 더 묻자 서현아 씨는 이런 답을 내놨다. “테크노는 일견 반복적이고 단조롭게 느낄 수 있는 음악이면서 집중하기에는 훨씬 좋아요. 아쉬탕가 요가를 하면 같은 시퀀스를 외워서 계속 반복 수련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가운데 잡생각은 사라지죠.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서현아 씨는 평소 프리 다이빙이나 서핑도 즐긴다. “물속에서 나는 고요한 ‘웅웅’거림이 앰비언트 사운드처럼 느껴져요. 세상과 동떨어져 오롯이 혼자죠. 요가도 내 매트 위에서, ‘나’라는 세계 안에서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함께 요가하는 다른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받죠. 테크노 음악을 틀다 보면 온통 캄캄한 와중에 모두가 여기에 푹 빠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구나 생각하죠.” 박민규 씨는 코로나가 끝난 뒤부터 프로그램에 요가와 명상을 꼬박꼬박 넣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의 중심으로 기를 모은다는 표현을 써요. 기를 모아 한데 어우러져 ‘우리’가 되는 거죠. 댄스 플로어에서도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되는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테크노는 ‘밤문화’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박민규 씨가 처음 야외 테크노 페스티벌을 기획한 건 2017년 베트남에서 페스티벌 <이큐에이션>을 경험하고 나서다. “밤새 놀다가 아침에 해가 딱 떴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숫가에 앉아 책을 읽고, 그네를 타고, 수영을 하는데 다들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죠.” 처음 <디에어하우스>가 열린 곳은 남양주의 어느 산속이었다. 100명 남짓한 사람이 한곳에서 먹고 자며 종일 테크노를 즐겼다. 음악을 듣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서 테크노의 장르도 조금씩 달라진다. <디에어하우스>에서는 사람 몸만 한 피리의 일종인 ‘디저리두’나 납작한 원형 통을 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핸드팬’ 같은 전통 악기가 등장한다. ‘트라이벌 사운드’라는 아날로그 테크노 장르다. ‘오가닉 테크노’라고 퉁쳐 부르기도 한다. 디저리두에 미디를 연결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테크노를 선보이는 연주자 타잔로카는 “시작은 순환 호흡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스승을 만난 뒤, 땅바닥에서 혼자 1시간씩 연습하면서 스스로 익혔어요.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내 몸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이 나만의 명상이지 않았나 싶어요. 명상이라는 게 꼭 고요한 공간에서 눈 감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에 팍 꽂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화를 풀 때, 울적할 때, 소름 돋는 자극이 필요할 때 디저리두를 불어요.” 이번 <디에어하우스>의 ‘플레이 앤 메디테이션’ 섹션에 참가한 그는 연주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던 관객을 기억한다. “자연의 소리를 많이 따려고 했어요. 동굴에서 시작해 불도 쬐다가 바다를 만나 수영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풀숲으로 가까워져서 <디에어하우스>가 펼쳐지는 장소와 합일되는 시퀀스였어요. 일종의 사운드 배싱(Sound Bathing)이었던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5월 말 나는 양양으로 가는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스테이지로 향하기를 반복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포레스트 존’에서는 사람들이 우비를 벗어 던지고 비 내리는 풀숲에서 춤을 췄다. 정신없이 몸을 흔들던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나무 사이로 달빛, 미러볼, 사이키델릭 테크노, 가늘게 떨어지는 빗줄기만이 몸의 모든 감각을 점령했다. 새벽이 되자 진흙탕이 된 바닥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사람이 생겼다. 해 뜨는 와중에도 비트는 점차 격렬해지기만 했다. 마지막 헤드라이너의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즈음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꼬박 6시간이 걸렸다. 꿈만 같았다. 나는 어느새 다음 레이브를 기다리게 됐다. 졸음인지 최면인지 알 수 없는 트랜스 상태에 점령당하는 그 순간을.
- 에디터
- 김예린(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그래퍼
- I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