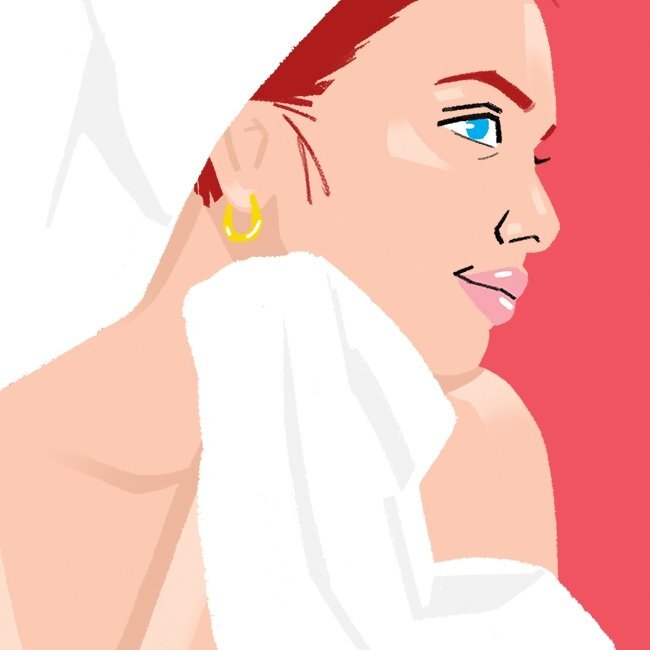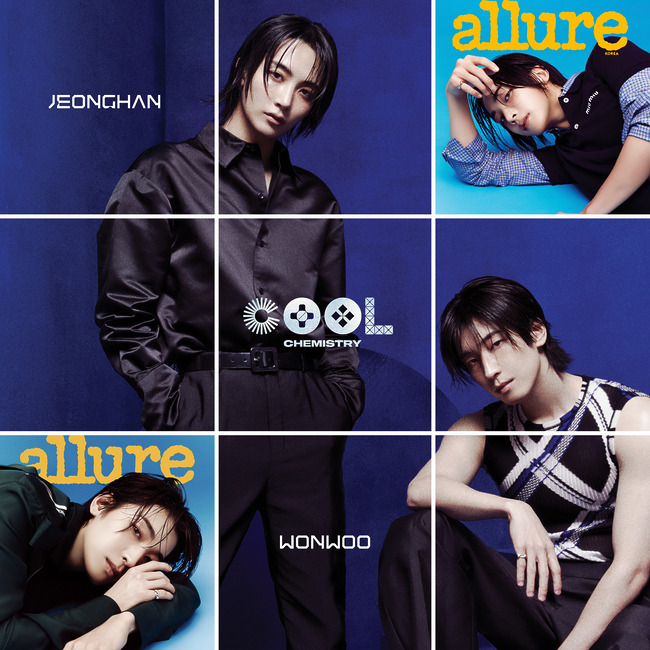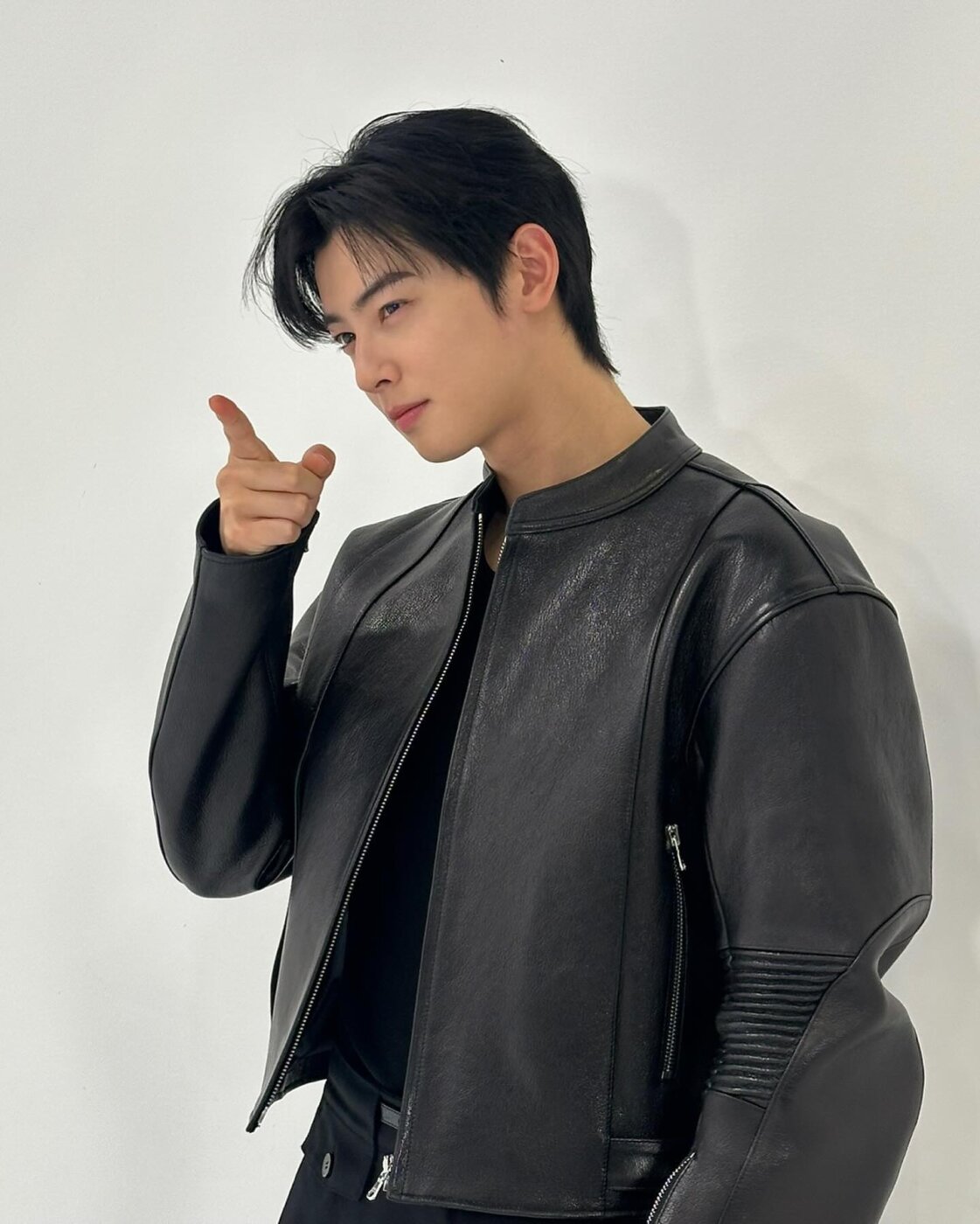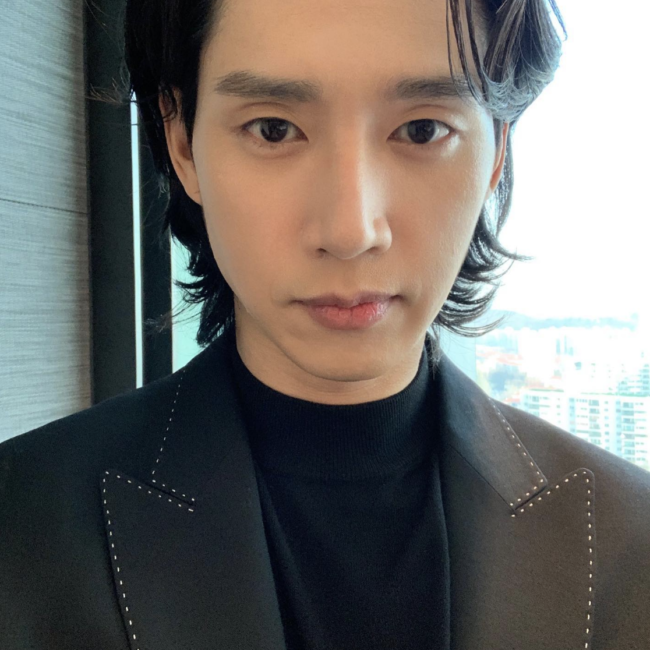뿌리로부터
서늘해진 계절을 무사히 날 힘이 여기에 다 있다. 땅의 기운을 머금은 뿌리채소의 맛과 멋.

| 연 근 |
연근은 연꽃의 땅속줄기다. ‘근(根)’은 한자로 뿌리를 의미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물속 진흙에 깊이 박힌 줄기로 보는 게 맞다. 레몬즙에 맞먹는 양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는다면 구멍 송송 뚫린 생김새 탓일 터. 평균 8~11개 정도 되는 구멍은 물속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땅속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가을에 수확한 연근은 즙이 많아 특히 맛있다. 아삭하지만 씹을수록 차진 식감의 매력이 극에 달한다.

| 당 근 |
이맘때쯤 제주 구좌에는 당근 수확이 한창이다. 사시사철 쉽게 구할 수 있다지만 가을, 겨울의 당근은 더 귀하다. 찬 기운을 이겨내고 단단히 여문 덕에 단맛은 배가되고 식감도 아삭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근은 표면이 매끈하고 곧게 뻗은 것일수록 달큼한 맛이 강하다. 한국 음식에서는 찜이나 탕에서 푹 익어 부드럽다 못해 말캉해진 당근을 쉽게 맛볼 수 있다. 오도독 씹는 맛을 원한다면 새콤달콤한 오일 드레싱에 버무린 당근 라페가 제격이다.

| 우 엉 |
길게는 땅속 60cm까지 뿌리를 내리는 우엉은 향이 진한 채소다. 바싹 말려 차로 우려 마실 때 특유의 쌉쌀한 흙내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흙이 묻은 상태로 신문지에 둘둘 말아 냉장 보관하면 풍미가 오래 유지된다.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사포닌은 껍질에 많다. 우엉의 진가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흙과 불순물은 칼등으로 살짝 손질해 껍질째 먹어보길.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알려진 리그닌은 우엉을 자를 때 생성된다. 가늘게 채 썬 우엉 요리가 많은 이유다.

| 고 구 마 |
편의점 앞이 고소한 고구마 냄새로 진동한다는 건 날이 추워졌다는 신호다. 으슬으슬 찬 바람이 불 때의 고구마는 어느 때보다 달다. 퍼석하고 단단한 밤고구마나 촉촉한 물고구마도 좋지만, 단호박처럼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의 당도를 따라갈 자는 없다. 생으로 먹는 고구마는 밤과 비슷한 맛이 난다.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느껴질 만큼 촉촉하다. 찐고구마를 크게 베어 물 때 이 사이사이에 끼는 가는 심지는 섬유질로 이뤄진 것이다. 양질의 식이섬유는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 줄기는 볶음이나 무침으로, 잎은 김치나 장아찌로도 먹으니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 무 |
‘가을 무 꽁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는 말이 있다. 무는 뿌리에 영양을 저장하는 대표적 덩이뿌리채소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말이다. 예년보다 추워진 가을, 무가 살아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따뜻한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여름 무는 수분이 많고 알싸한 맛이 강하다면, 가을 무는 훨씬 달고 고소하다. 가을 무의 껍질은 속살에 비해 비타민 C 함량도 2배 가까이 높다. 매운맛을 내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무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려고 생성된다. 이로 베어 물어 씹을 때 매운맛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무의 항암·항균 기능은 이 성분에서 비롯된다니 매운 무도 환대받아 마땅하다.

| 마 |
마가 자양 강장에 탁월하다는 건 ‘산에서 온 장어’라는 별칭만 봐도 알 수 있다. 뮤신 성분은 마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 생마의 단면을 썰었을 때 묻어나는 미끈한 점액질이 그것이다.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니 속이 쓰리거나 위에 탈이 났을 때 마를 갈아 마시면 좋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특유의 끈적임이 힘들다면 우유나 요구르트를 섞어 갈아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